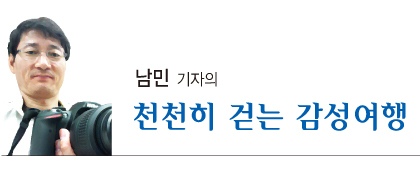
[헤럴드경제=고창]우리는 선운사 경내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천마봉과 낙조대, 마애불, 내원궁, 도솔암 일대를 도는 아름다운 제1코스를 다녀온 후 들러기로 했다.
천왕문 앞은 도솔천이 흐른다. 도솔암 위쪽에서 발원한 내천이 선운사 앞을 거쳐 곰소만으로 흘러 들어간다. 도솔천은 서해안 지역에서는 드물게 동쪽으로 흐르는 동류천(東流川)이다.
|
| 천마봉 정상서 바라본 도솔암과 마애불, 내원궁. 주변 경치가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여 절경이다. |
도솔암으로 향하는 길은 넓고 평탄했다. 옛날 시골의 신작로 같았다. 흙길이라 걷는 기분도 좋았다. 아직 나뭇잎이 없지만 신록이 우거지면 하늘을 가리는 숲이라고 했다. 여름에도 햇빛을 다 가려준다고 한다. 도솔천을 가운데로 해서 올라가는 오른쪽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넓은 도로이고 왼쪽은 오솔길로 유독 그 길을 택해 걷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는 넓은 큰길로 올랐다. 도중에 수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복장을 하고 몰려 내려왔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전라도 지역 문화유적 답사를 왔다고 했다. 유니폼에 '국사학과'라고 한자로 적혀있었다. 몇몇은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고 지나갔다.
|
| 도솔천의 검은 바닥은 타닌 성분 때문이다.(왼쪽) 서울에서 문화답사 온 대학생들이 인사하며 지나갔다.(오른쪽) |
노송은 천년기념물 장사송(長沙松)이다. 수령 60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사송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의 옛 지명이 장사현이었다는 것에 착안, 1975년 천연기념물 지정때 이 이름을 붙인 것이다.
|
| 한때 신라 진흥왕이 기거했다는 전설로 진흥굴이라 부른다.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에 임해줬다. |
산행을 온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멋진 경치를 깔고 앉아 도시락을 즐기고 있었다. 마치 천하의 절경을 발 아래 두고 즐기는 신선 같은 느낌을 줬다.
|
| 천마봉의 절경. 왼쪽 작은 사진은 천마봉 정상 절벽에 다가선 관광객, 주변 기암괴석, 정상 숲속서 도시락을 즐기는 관광객들. |
오솔길을 따라 용문굴로 향했다. 가는 길 나무숲 사이에서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바위틈 사이로는 이름 모를 키 작은 야생화들도 꽃을 활짝 피웠다. 용문굴은 거대한 바위다리 같이 생겼다. 그 아래 굴이 뚫렸는데 벽에는 한자로 3명의 이름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었다.
|
| 낙조대(위 왼쪽)와 용문굴. 그리고 오솔길에 피어난 키작은 야생화들. |
도솔암에 이르기 직전 거대한 석벽에 새겨진 마애불상이 발길을 붙잡았다. 바로 앞에 서자 압도되는 느낌이 들었다. 조금 전 천마봉에서 바라봤던 그 마애불이다. 고려시대 작품으로 추정하는데 높이만도 15.6m, 보물 제 1200호다.
불상의 복부에는 검단선사가 쓴 비결록을 넣어뒀다는 감실에 복장비기(腹臟秘記)가 있는데 조선 중후기 전라도 관찰사 이서구가 감실을 열자 갑자기 벼락이 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그대로 닫아버렸는데 '전라감사 이서구 열어보다'라는 글이 남았다고 한다. 이 비결록은 19세기 말(1892년) 동학운동 직전 접주 손화중이 열어봤다고 소문을 내 동학도들을 많이 모집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한다.
|
| 도솔암 마애불상.웅장한 모습에 압도됐다 |
마애불상 옆엔 작은 나한전이 있고 그 옆엔 우리나라 '3대 지장보살 성지' 중 하나인 내원궁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니 아까 그 마애불상 머리 뒤쪽이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한다'는 지장보살 모셔진 곳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대원화 보살님과 잠시 이야기도 나눴다.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했다. 보살님은 "내가 기도하는 만큼 다 이뤄진다" 고 했다. 바위 절벽에는 석란 한 무더기가 자라고 있었다.
|
| 우리나라 3대 지장보살 성지라 불리는 내원궁이다. 절벽 위에 걸터앉아 있다. |
선운사는 매우 큰 절이었다. 경내를 천천히 두루 구경하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렸다. 이 절은 특이하다. 입구 천왕문을 들어서면 보통 절은 대웅전 등이 나오는데 여기선 만세루 현판의 큰 절집이 정면에 우뚝 서 있다. 옛날 강당 건물에서 창고로 쓰다가 지금은 주지스님이 방문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든 넓은 마루로 올라와 선운사 전통차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 건물 뒤에 대웅전이 6층 석탑과 함께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
| 선운사 대웅보전과 6층석탑. |
필자가 찾은 3월말 아직 동백은 꽃을 피우지 않았다. 경내에는 몇 그루의 산수유가 노란꽃을 피워 관광객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몰려 사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
| 사찰 뒤뜰 산비탈에 담을 쌓듯 군락을 이룬 동백. 2000여 그루로 추산되는 동백꽃이 조만간 활짝 필 기세다. |
경내를 돌아보는데 템플스테이 하러 온 젊은 여성들이 제법 눈에 띄었다. 사찰에서 입는 템플스테이복장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산수유나무 아래서 사색을 즐기는 모습도 보였다. 또 말레이시아에서 왔다며 여성 2명도 큰 캐리어를 끌며 템플스테이 건물을 찾았다.
경내를 다 구경한 후 종무소로 가서 주지 스님을 찾았다. 마침 산책 중이라고 해 경내서 주지스님을 만나 잠시 덕담 좀 듣고 싶다고 했더니 종무소로 안내하셨다.
주지 법만 스님은 필자를 요사채로 안내하고 검단선사가 이 절을 창건할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두루 해주셨다.
스님은 특히 지역사회의 복지와 교육, 문화 등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다. 특히 이 지역사회와의 유대와 복지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었다. 현재 고창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어린이집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법만 스님이 2007년 주지 취임 후 첫 작업으로 창고로 둔갑해 있던 만세루를 정비해 내방객을 위한 쉼터로 만들었다. 누구나 여기에서 선운사 고유의 차를 무료로 마시고 책을 읽으며 쉴 수 있다.
또 불교계에 획을 그을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노스님 노후수행마을 아이디어를 냈다.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다 노후에 쓸쓸한 상황을 맞이한 노스님들을 위한 수행마을을 선운사 옆에 지어 모시는데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국 근대문학의 터전을 일군 사찰로서의 재평가 작업이다. 일제시대 때 석전 박한영 스님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재평가하는 일을 추진 중이다. 석전 박한영 스님은은 일제의 불교장악에 맞서 한국 정통불교를 지켜온 스님으로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
|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절은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
법만 스님은 아직도 창고에 먼지로 덮인 자료가 수두룩하다며 이제 학계와 연계해 작업을 벌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스님은 문화재 입장료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 괜한 일로 국민과의 갈등이 유발되는 것 같아 마음도 아파해 했다. 입장료 내는 국민은 불교 신자는 신자 대로, 비신자는 비신자 대로 불만이 많다. 사찰 입장에서는 모든 자산 활동이 규제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과 대국민 홍보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길 바라고 있다.
법만 스님은 창건때부터 만들어 온 곰소 소금을 주민들이 1500년을 이어 매년 봄 가을 절에 보은염(報恩鹽)으로 보내온다면서 이젠 최고급 소금으로 만들어 전국민에게 공급하는 일에도 앞장 섰다고 한다. 황토구운소금, 선운사가 책임지고 품질을 보증한다고 했다. 선운사가 단순히 불교를 떠나 지역사회와 1500년을 함께 하는 모습에 크게 감명받았다.
이 부분에서 법만 스님은 명확하게 한 말씀 보탰다. "절이 절에 갇혀 있어선 안된다"고.
글ㆍ사진=남민 기자/suntopia@heraldcorp.com
- 헤럴드 생생뉴스
'그곳에 가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연이 담그고 세월이 익힌 우직한 醬 (0) | 2013.04.15 |
|---|---|
| 순천만,하늘정원..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0) | 2013.04.12 |
| 법흥사 템플 스테이-아름다운 절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다 (0) | 2013.03.27 |
| 레일 위를 덜컹덜컹 낭만싣고 心바람난다 (0) | 2013.03.26 |
| 바람결에 색동 갈아입는 섬 (0) | 2013.03.25 |









